추가설명자료: 내 주변에 꽉 찬 속이 검은 디지털 공간
이 추가설명은 [4화 경험의 발견과 창출]란 글의 [4. 깨어있는 두뇌와 디지털 공간과의 공존]에서 거론되었던 속이 검은 디지털 공간에 대한 것이다. 과연 그들은 누굴까?
‘속이 검은 디지털 공간’들은 기만적이다. 겉보기에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착취하고 있다. 나를 중심으로 몰아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논리에 나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디지털 공간들은 처음부터 나를 잘못 정의하고 있었고, 서비스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휴대폰이든 컴퓨터를 통해, 때로는 내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들여 놓는 매일 접하는 디지털 공간도 있다.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반기는 듯하다. 인터페이스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빠르게 응답하며, 개인적인 느낌을 준다. “이 공간은 내거야!”라고 말해주고, 심지어 내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천천히, 멈춰 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마치 공간이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찰하는 것 같다.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 같다. 나는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클릭 수, 시간, 그리고 예측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동의 원천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검은 디지털 공간’들의 의도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공간과 같다. 그리고 그 의도가 항상 나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공간의 바깥, 즉 내가 보고 만지는 부분은 깨끗하고, 도움이 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논리라는 것은 바로 내가 결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결정이 내려진다. 다음에 무엇을 볼지, 무엇을 보지 못할지, 무엇을 나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할지에 대한 결정 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서 나는 결코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른다.
결국, 이 공간은 두 얼굴을 가진 공간이다. 나를 매료시키는 얼굴과 나를 이용하는 얼굴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나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즘 소위 “개인화”되었다고 말하는 디지털 환경, 즉 나를 알고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약속에 쉽게 빠져들기 쉽다. 그들은 나의 선호도를 이해한다고 한다. 나를 돕기 위해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들은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바라봐 주기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그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패턴이다. 내가 무엇을 클릭했는지, 무엇을 구매했는지, 이미지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마우스를 댔는지,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나를 머무르게 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의 모습이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것이다.
문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표적이어서 추적당하고, 넛지 당하고, 측정당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친근해 보일지 모른다. 깔끔한 인터페이스, 귀여운 아이콘, “좋은 아침입니다!”와 같은 친근한 메시지를 주지만, 더 깊은 논리, 이 모든 것의 진짜 목적은 나의 웰빙이 아니라 최적화이다. 이익과 영향력, 그리고 통제의 끝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다.
내 스토리텔링의 중심인 MASERINTS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기반한 나의 모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나의 움직임, 리듬, 침묵, 의도함, MASERINTS는 단순히 나의 클릭 소리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 끊임없는 주의집중력을 빼앗는 인터랙션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백그라운드로 사라지며 주변 공간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나의 경험, 나의 욕구, 나의 순간들이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한다.
그 차이는 미묘하다고 여길 지 모르지만 아주 깊다. 하나는 내 주위를 맴도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서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가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내 주위를 맴도는 것이다. 데이터 소스나 마케팅 세그먼트가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서 말이다.
그러니 이러한 기만적인 시스템에 이름을 붙이려면, 그것을 시적이거나 영리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 “개인화된 공간”이 아니라, “개인화된 거짓공간”이라고 말이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 아니라, 마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단단한 그물망 속으로 끌어당기는 디자인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MASERINTS는 단지 그들의 정반대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다. 사람은 연구하거나 판매할 대상이 아니라, 조용하고 충실하며 품위 있게 섬겨야 할 존재로서 진정으로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은 디자인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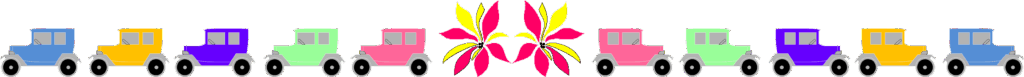
목 차
프롤로그
떠오르는 기억들의 알 수 없는 연관성
추가설명자료: 메워지는 경험(Filler)의 정체
- 스마트한 사람이 되려면
추가설명자료: DAGENAM의 접근 방법
추가설명자료: 경험의 창출 - 신기한 두뇌의 작업
2.1 편해진 삶 속에 굳어진 나의 두뇌
추가설명자료: 나이를 먹게되면 굳어지는 두뇌 - 스마트하다는 표현의 속 뜻
3.1 스마트한 사람과 ‘간접경험’의 존재
3.2 ‘간접경험’과 기억의 자국
3.3 ‘단위경험’이란?
3.4 ‘단위경험’이 많아지면, 창의성에 유연성이 증가
추가설명자료: 기억의 깊은 자국
추가설명자료: ‘대체경험’과 기억의 깊은 자국
추가설명자료: 나의 스마트한 디지털 공간
추가설명자료: ‘단위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까?
추가설명자료: 내연기관의 부품수
추가설명자료: 습관과 덩어리 경험
추가설명자료: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란 - 깨어있는 두뇌와 디지털 공간과의 공존
4.1 나의 삶의 흐름과 너무 가까워진 기술들
4.2 내가 기술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추가설명자료: 내 주변에 꽉 찬 속이 검은 디지털 공간
추가설명자료: 디지털 공간의 위험성
추가설명자료: UCA(Ubiquitous Computational Access)
추가설명자료: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수준 판단
추가설명자료: ‘증강현실’ 기술의 현재 수준 판단
추가설명자료: ‘Ubicomp’ 기술의 현재 수준 판단
추가설명자료: 기술들이 사람들의 삶의 흐름을 점차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다 - 두뇌를 깨우는 간단한 방법
-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을 발견하는 것
6.1 두뇌의 깨어남과 ‘주체적행동능력’의 회복
추가설명자료: 맥락이 모든 것을 결정 - 컴퓨터는 어떻게 경험을 발견하고 창출할까?
7.1 컴퓨터는 경험을 단순화시키지 않는다 - 두뇌 어딘 가에 있을 잊혀 진 그 무엇을 찾아서
8.1 나의 하루가 미래의 시나리오가 될 때
추가설명자료: 인간의 인식 능력 - 경험을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 창출을 경험한다는 것?
10.1 창출의 시도
10.2 ‘두뇌동작 시뮬레이션’을 위한 도표
에필로그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의 만남
Last Updated on 2025년 11월 02일 by MASER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