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설명자료: DAGENAM의 접근 방법
이 추가설명은 [4화 경험의 발견과 창출]란 글의 [1. 스마트한 사람이 되려면]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또 덩어리 되어 있다면 그것을 쪼개서 무수히 많은 ‘조각경험’으로 분리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뇌가 해 주었으면 하는데, 두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DAGENAN의 접근 방법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든 사람은 내면에 특정 경험들에 대해 은밀하게 “달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숙달됨(기량)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발끈을 묶는다든가, 익숙한 길을 운전한다든가,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 등을 잘 생각해 봐도 그런 달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마치 하나의 매끄러운 “경험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순간에 일어난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볼 수 없다. 모두 어느 정도는 일상의 달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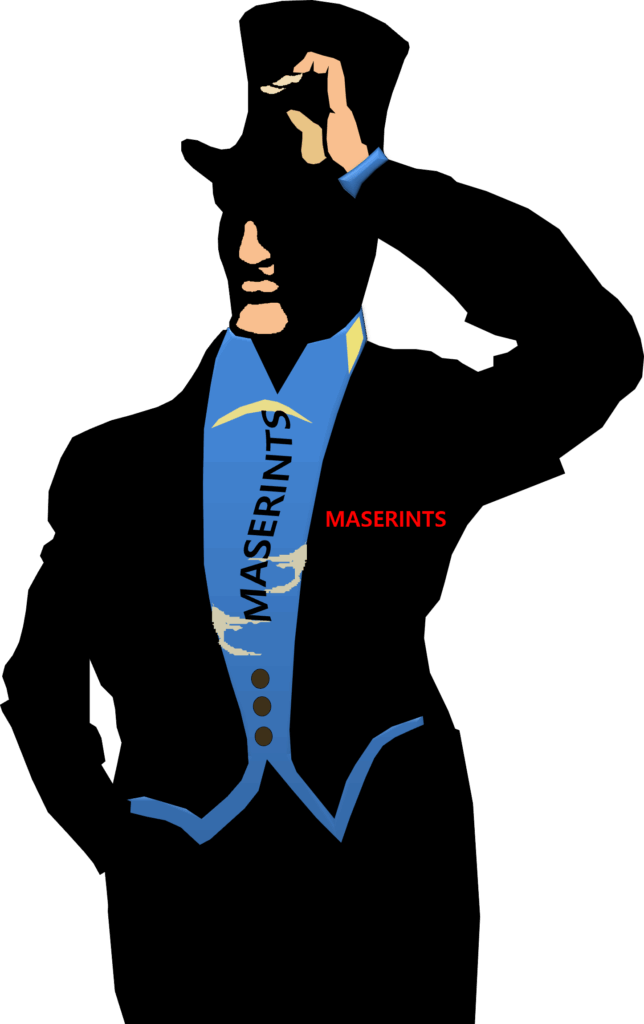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청킹(Chunk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두뇌 자체가 작고 세부적인 단계들을 하나의 숙달된 행동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한때 주의 깊게 집중해야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치 제2의 천성처럼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경험이 뭉쳐지게 되면 그 경험이 크든 작든 간에 그 경험은 거의 그 자체의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감춰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매듭을 어떻게 묶었는지, 혹은 식사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많은 미세 단계가 있었는지 자문해 보면, 커다란 실타래만 보이지, 어떻게 감겨 있게 되었는지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두뇌는 그 숨겨진 단계들을 하나의 ‘전체’로 뭉쳐 놓았다. 이 실타래가 어떻게 감겼는지 드러내려면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다시 풀어야(분해) 하지 않을까?
두뇌가 깨어나서 그 숨겨진 단계를 모두 분해해서 다시 새로운 조합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런 분해과정은 두뇌의 본질적인 욕구에 거스르는 것이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해 과정을 좀더 속도를 내려면, 별도의 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의 덩어리 된 경험을 가지고 머리 속에서 어떻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끄집어 내서 그리고 그것을 분해하여, 눈으로 그 쪼개긴 경험들의 내용을 보도록 하는 훈련이다. 그렇게 쪼개진 경험들에 대한 시각적인 입력으로 나머지는 두뇌의 본질적인 욕구에 맡겨 두는 것이다.
이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종이에 내가 덩어리 된 경험을 적어 놓고 그 경험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 다음 그 시작과 끝 사이의 모든 과정을 쪼개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시각적인 입력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크거나 작은 경험에도 모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평범하고 매끄러운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 그 덩어리 경험을 종이에 적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이 하나의 덩어리 경험을 백 개, 심지어 이백 개 이상의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다. 한때 무의식적으로 열 번에서 스무 번 정도만 움직여 완성했던 것들이, 따져보면 훨씬 더 긴 시퀀스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두뇌를 깨운다고는 하지만, 쉽게만 생각되던 그 경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그 속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깊은 의미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저 한개의 덩어리가 된 경험을 계속 나누기만 하면, 내 두뇌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경험’ 혹은 ‘단위경험’을 다룰 때,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조합하여 ‘간접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1화 나의 스토리텔링의 시작]에서 소개되었던 [5. 혼돈 속의 패턴추구자]라는 글이 생각나고, 또한 [3화 DAGENAM에서 MASERINTS로]라는 글에서 [4. Matthew Hutson의 ‘여섯 번째 감각’과 MASERINTS]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두뇌는 패턴을 찾는 기관이다. 혼돈 속에서도 패턴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두뇌가 바로 이렇게 대단하다.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의미가 있는 경험들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을 수도 있지만, 과거 경험의 부분들을 다른 조립으로 하여 다시 결합함으로써 가능성으로 떠오르는 또 다른 지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뇌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두뇌는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조각들을 가져와 마치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것처럼 새로운 연결된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내가 덩어리가 된 경험들을 끄집어 내서 쪼개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컴퓨터에 이러한 능력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DAGENAM이 생겨나게 된 아이디어이다. 그래서 DAGENAM의 개념은 MASERINTS의 하나의 터미널 시스템으로 될 수 있다. 조금은 복잡하겠지만, 그런 개념적 디자인에 도전하게 만들어 준다. DAGENAM은 나의 기억된 경험들을 수집하고, 이를 수많은 조각으로 분해한 후, 새롭고 의미 있는 형태로 다른 조합으로 새로운 결합을 이루어 재조립하도록 디자인된 체계이다. 그러나 두뇌와 달리 컴퓨터는 이를 위해 무엇인가 사람이 해야 한다. 분해하고 또 모든 다른 조합으로 새로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는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할 것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충분한 디자인을 통해 이러한 창의적인 작업을 모방할 수 있다. 즉, 경험을 수백 개의 단계로 분해한 후, 이를 재조립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스마트한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는 시스템인 MASERINTS의 더 큰 환경에 연결되면 DAGENAM의 개념은 MASERINTS의 하나의 터미널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재조립된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풍부하게 되고 그 디지털 결과물은 VPTS(Virtual PTS)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인간과 달리 MASERINTS는 망각을 경험하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DAGENAM을 통해 축적되는 ‘간접경험’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VPTS가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패턴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패턴은 실제 사람(PTS)의 요구를 예측하거나 섬세한 방식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이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히려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인간의 두뇌는 다른 조합으로 다신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기억이 정적인 저장고가 아니라 내가 기억할 때마다 경험의 단편들을 재구성하고 재조립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고 오랫동안 관찰해 왔다. 만약 두뇌가 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더 느리고 더 경직된 컴퓨터도 동일한 원리를 따르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DAGENAM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MASERINTS는 단순히 명령에 응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경험의 재조합을 통해 도출된 기대, 예측, 통찰력, 그리고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PTS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두뇌의 숨겨진 기능, 즉 단편들을 모아서 연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변환하는 기법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기술에 반영될 수 있다. 차이점은 나는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MASERINTS와 같은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접경험’의 저장소는 나의 기억보다 더 깊어지고, 일종의 확장된 상상력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두뇌와 DAGENAM은 같은 기술을 공유하는 파트너인 셈이다. 경험 속의 보이지 않는 실을 발견하고 혼돈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며, 단서와 실마리를 가지고 이를 새로운 패턴으로 엮어내는 것이다. 하나는 유기적으로, 다른 하나는 기계적으로 이를 수행한다. 두 시스템은 과거 경험 자체가 미래를 품고 있는 기억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발명하는 것의 원재료가 되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사람의 두뇌에는 현재에 미래의 기억들이 존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1) Constructive Memory, The Decision Lab, https://thedecisionlab.com/reference-guide/psychology/constructive-memory
“구성적 기억(Constructive Memory)”에서 기억은 과거를 완벽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만드는 구성적이라는 것이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내 두뇌는 저장된 정보 조각, 기대, 심지어 상상력을 사용해서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억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억은 재생보다는 재구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소 퍼즐과 같이 모든 조각 모양이 원래 상자에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퍼즐에서 조각을 빌리거나, 빈칸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조각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은 유연해 보이고, 유용할 것 같지만,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AGENAM은 ‘조각경험’이나 ‘단위경험’들과 같은 과거 감각 데이터 조각들을 다른 조합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종류의 ‘간접경험’을 생성하는 ‘간접경험생성기(Indirect Experience Generator)’라는 체계의 개념적 디자인이다. 마치 의도적으로 “구성적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DAGENAM에는 ‘경험의미부여기(Experience Meaning Grantor)’라는 체계도 있는데, 이런 작업이 두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다.
MASERINTS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과거 행동, 감정, 선택의 흔적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맥락을 재구성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비슷한 기억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주변 맥락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개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뇌가 조각경험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 때 두 조각경험 간을 연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로 메우게 된다고 했다. 그것이 왜곡된 경험을 만들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자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DAGENAM에서는 이 부분을 구현할 때 두뇌가 만드는 간접경험보다는 왜곡될 확률이 적어질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두 체계의 개념이 모두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경험의 조각들을 활용하여 나의 미래에 무엇을 인지하고, 결정하고, 심지어 예상하는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MASERINTS는 맥락을 재구성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둘 다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바로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2) Reconstructive Memory, 2025.8.18, https://en.wikipedia.org/wiki/Reconstructive_memory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단순히 저장고에서 완벽한 기록을 꺼내는 것이 아니다. 대신 두뇌는 저장된 정보 조각들과 나의 기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상상력을 섞어서 매번 기억을 재구성한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기억은 사실과 해석이 뒤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사건을 잘못 기억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빈틈을 메우는 것이다. 기억은 유연하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것이다.
DAGENAM은 ‘간접경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었다. 마치 나의 두뇌가 과거 경험의 조각들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감각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낸다. 두뇌의 ‘재구성 기억’과 매우 유사하지만, DAGENAM은 이를 하나의 체계로 의도적으로 수행한다. DAGENAM에서는 ‘경험의미부여기(Experience Meaning Grantor)’라는 체계가 있는데, 두뇌의 재구성 기능과 유사하게 의미가 있는 간접경험이 되도록 구성하게 된다.
MASERINTS는 실시간으로 맥락을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맥락을 더욱 발전시킨다. 기억이 과거를 조각조각 이어 붙이듯이, MASERINTS는 PTS의 흔적, 즉 행동, 습관, 욕구의 흔적을 조각조각 이어 붙여 PTS에게만 도움이 되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정확한 재생이 아니라, 현재 PTS가 행동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재구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재구성 기억’은 두뇌 속에 있고, DAGENAM은 경험을 통해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MASERINTS는 맥락을 통해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 가지 모두 현실은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된다는 같은 원리를 따른다.
심리학에서 “재구성 기억”이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두뇌가 완벽하게 녹음된 것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의 조각들과 상상력, 감정, 그리고 그 이후로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마치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들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DAGAMi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기억 대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감각적 또는 정서적 경험의 단편들을 가져와 다른 조합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간접경험’을 만들어낸다.
DAGAMi는 사람들의 두뇌가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경험을 “재구성”한다. MASERINTS는 그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MASERINTS는 PTS 주변의 공간, 즉 맥락을 재구성하여 사람이 느끼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을 형성한다.
(3) Memory’s Imperfection: Evolutionary Benefits of Forgetting and Reconstructing, 2024.10.3, https://medium.com/global-science-news/memorys-imperfection-evolutionary-benefits-of-forgetting-and-reconstructing-b442e7986552
기억은 과거 사건의 정적이고 정확한 재현이 아니라, 변화와 왜곡에 취약한 역동적인 재구성이다. 외부의 영향, 현재의 감정 상태, 심지어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도 과거의 기억을 바꾸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4) Cognitive Neuroscience Perspective on Memory: Overview and Summary, 2023.7.26,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0410470
(5) Episodic Retrieval and Constructive Memory/Imagination, 2018, Daniel Schacter, UCI, Irvine https://www.youtube.com/watch?v=sAhe8sR2auw,
Daniel Schacter는 이 영상에서 내가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 미래의 사건을 상상할 때, 나의 두뇌는 단순히 경험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 겹친다. 기억하든 시각화 하든 유사한 두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 개념을 구성적 일화 시뮬레이션 가설 (Constructive Episodic Simulation Hypothesis)이라고 한다.
두뇌가 기억 조각들로부터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DAGENAM은 분해된 경험 단계들을 거쳐 새롭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재구성한다. DAGENAM은 재구성을 수행하지만, 프로그래밍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MASERINTS는 이렇게 재구성된 내용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VPTS)을 구축한다. 이는 두뇌가 기억을 단순히 기억을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하는 데에도 사용하는 방식을 반영하며, 상상력은 미래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준다.
Schacter는 기억과 상상력이 재구성을 통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DAGENAM은 이런 방식으로 경험을 재구성한다. MASERINTS는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뒷받침한다. 마치 상상력이 내가 미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 Putting Together the Puzzle of Adaptive Constructive Memory, Daniel Schacter, 2019, Q&A with Daniel Schacter, 인지신경과학회의 구성적 기억에 대한 요약, https://www.cogneurosociety.org/adapting-to-a-new-way-of-thinking-about-our-constructive-memory
(6) The Future of Memory: Remembering, Imagining, and the Brain,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3815616
이 연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미래를 상상하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것 사이에 놀라운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여기에는 기억과 상상이 모두 공통된 두뇌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포함되었다.
(7)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Constructive Memory: Remembering the Past and Imagining the Future, Daniel Schacter,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2429996
이 글에서 Daniel Schacter는 나의 기억 체계가 과거를 완벽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마다 두뇌는 저장된 정보 조각, 기대, 그리고 상상을 섞어 기억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결함이 아니라 적응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나는 강력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획하거나 예측하려면 과거 경험의 특징을 창의적으로 재조합하여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에 따르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동일한 두뇌 영역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한다.
DAGENAM은 이러한 정신적 과정을 의도적으로 반영한다. 두뇌처럼 DAGENAM은 저장된 경험을 조각조각 쪼개 새로운 ‘간접경험’으로 재구성한다. MASERINTS는 이러한 인공적 구조를 사용하여 필요를 예측하고 맥락을 만들어낸다. 마치 두뇌의 기억-상상 고리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과 같다. 즉, Schacter는 과거의 기억조각들을 재구성하고 미래의 상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DAGENAM과 MASERINTS는 이러한 과정을 재현하여 기계가 인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기억하고 상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The Seven Sins of Memory: How the Mind Forgets and Remembers, Schacter, 2012,
- https://en.wikipedia.org/wiki/The_Seven_Sins_of_Memory
- https://www.apa.org/monitor/oct03/sins
- https://www.amazon.com/Seven-Sins-Memory-Forgets-Remembers/dp/0618219196
- https://www.psychologytoday.com/us/articles/200105/the-seven-sins-of-memory
(9)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Worth Publishers. Anderson, J. R. 2010, , https://psycnet.apa.org/record/2000-07214-000
이 책은 마치 “덩어리 경험”을 더 작은 단계나 ‘조각경험’으로 나누는 DAGENAM처럼 작은 인지 과제들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결합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 책은 정신적 과정을 분해 가능한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이는 DAGENAM이 경험을 조각으로 분석하도록 디자인될 수 있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하다.
- https://psycnet.apa.org/record/2000-07214-000
- https://www.amazon.com/Cognitive-Psychology-Implications-John-Anderson/dp/1429219483
- https://www.goodreads.com/book/show/4919146
(10) The Psychology of Memory Reconstruction, Sutton, 2010,
- The psychology of memory, extended cognition, and socially distributed remembering, John Sutton, Celia B. Harris, Paul G. Keil & Amanda J. Barnier, 2010, https://philarchive.org/rec/BARTPO-25
- The Psychology of Memory, Extended Cognition, and Socially Distributed Remembering(2010), Sutton, Harris, Keil, & Barnier, https://www.academia.edu/361289/The_Psychology_of_Memory_Extended_Cognition_and_Socially_Distributed_Remembering_Sutton_Harris_Keil_and_Barnier_
(11) Schema (psychology), https://en.wikipedia.org/wiki/Schema_(psychology)
(12) Chunking (psychology), https://en.wikipedia.org/wiki/Chunking_(psyc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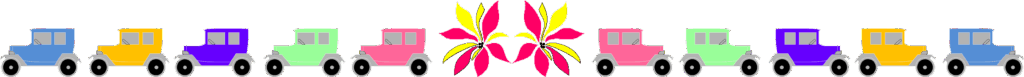
목 차
프롤로그
떠오르는 기억들의 알 수 없는 연관성
추가설명자료: 메워지는 경험(Filler)의 정체
- 스마트한 사람이 되려면
추가설명자료: DAGENAM의 접근 방법
추가설명자료: 경험의 창출 - 신기한 두뇌의 작업
2.1 편해진 삶 속에 굳어진 나의 두뇌
추가설명자료: 나이를 먹게되면 굳어지는 두뇌 - 스마트하다는 표현의 속 뜻
3.1 스마트한 사람과 ‘간접경험’의 존재
3.2 ‘간접경험’과 기억의 자국
3.3 ‘단위경험’이란?
3.4 ‘단위경험’이 많아지면, 창의성에 유연성이 증가
추가설명자료: 기억의 깊은 자국
추가설명자료: ‘대체경험’과 기억의 깊은 자국
추가설명자료: 나의 스마트한 디지털 공간
추가설명자료: ‘단위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까?
추가설명자료: 내연기관의 부품수
추가설명자료: 습관과 덩어리 경험
추가설명자료: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란 - 깨어있는 두뇌와 디지털 공간과의 공존
4.1 나의 삶의 흐름과 너무 가까워진 기술들
4.2 내가 기술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추가설명자료: 내 주변에 꽉 찬 속이 검은 디지털 공간
추가설명자료: 디지털 공간의 위험성
추가설명자료: UCA(Ubiquitous Computational Access)
추가설명자료: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수준 판단
추가설명자료: ‘증강현실’ 기술의 현재 수준 판단
추가설명자료: ‘Ubicomp’ 기술의 현재 수준 판단
추가설명자료: 기술들이 사람들의 삶의 흐름을 점차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다 - 두뇌를 깨우는 간단한 방법
-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을 발견하는 것
6.1 두뇌의 깨어남과 ‘주체적행동능력’의 회복
추가설명자료: 맥락이 모든 것을 결정 - 컴퓨터는 어떻게 경험을 발견하고 창출할까?
7.1 컴퓨터는 경험을 단순화시키지 않는다 - 두뇌 어딘 가에 있을 잊혀 진 그 무엇을 찾아서
8.1 나의 하루가 미래의 시나리오가 될 때
추가설명자료: 인간의 인식 능력 - 경험을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 창출을 경험한다는 것?
10.1 창출의 시도
10.2 ‘두뇌동작 시뮬레이션’을 위한 도표
에필로그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의 만남
Last Updated on 2025년 11월 02일 by MASERINTS